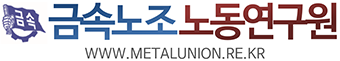두려움에 중독된 우리들
김영수 (경상대)
우리들 모두가 평온한 것 같다.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거짓말만 빼고는 참으로 조용하다.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만이 온누리를 휘감은 듯하다. 세계는 온통 경제위기로 떠들썩하고, 우리나라는 G20회의에서 경제위기의 구세주를 만들어낼 것처럼 들떠 있는데, 노동현장이나 생활현장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 G20회의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위해 노점상 철거 및 집회 불허의 역사를 되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경제위기의 구세주를 찬양하고자 노동쟁의뿐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까지 저 멀리 내 던져 버린 것 같다. 우리들은 마치 떠들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병마에 시달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만의 느낌일까?
올 해는 전노협 창립 20주년이다. 전노협을 출범시키기 위해 눈보라를 헤치고 수원의 성균관대로 내달렸던 일을 바로 어제의 일로 기억하는 노동자들이 많겠지만, 그 일은 어느덧 20년 전에 있었다. 20년의 세월 속에서 많은 것들도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노협의 상징이자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아니 노동운동의 얼굴이었던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성․계급성․연대성이 찢어지고 색이 바래 박물관의 유물로 보관되어 있는 깃발처럼 먼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운동을 하든 하지 않든 20년 전의 전노협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20-30대의 청년 노동자들이 자식들의 노동능력을 구비해주어야만 하는 40-50대의 늙은 노동자로 변해서일까. 단칸방에서 피곤한 몸을 달랬던 노동자들이 중대형 아파트로 이사 가서 살기 때문인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일까.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어깨는 축 처졌고 두 발은 약해졌다. 투쟁의 주먹을 끌어올릴 어깨와 노동현장과 거리를 힘차게 달릴 두 다리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중독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것들을 얻기도 했고 잃어버리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전노협으로 모아 낸 이후, 수많은 권리를 싸움으로 얻기도 했고, 1997년 말부터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희생양이 된 이후 지금까지 정리해고라는 두려움에 중독된 상태로 살고 있다. 이 병마는 ‘나는 아닐 것이다, 나만이라도 살자, 잘리기 전에 돈이라도 벌자’라는 증상으로 나타났다. 싸우고 있는 사업장의 몇몇을 제외하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 같은 증상이다. 사람은 없고 깃발만 나부낄 뿐이다. 친구도 없는데 무슨 동지란 말인가. 노동조합은 간부들만 남아 있다. 회사에 기대는 것이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름길로 착각한다. 참으로 너무나 지독해서 치료하기 힘든 병마인 것 같다. 이런 병마는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계급성․연대성을 갉아먹는 전염병이었다. 노동자들은 그 병마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국가폭력에 항복하였다. 노동자들은 막가파 앞에서 고개 숙이고, 돈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버티기 앞에서 무르팍을 땅으로 내려놓았다. 국가와 자본의 무수한 폭력을 ‘전노협 사수투쟁’으로 이겨내면서 정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노동자들, 이제는 그들이 두려움에 중독되어 버렸다. 우리 모두가 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드디어 민주주의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선거만이 민주주의가 아닐진대, 선거의 결과만이 민주주의 꽃으로 등장하였다. 선거 이외의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를 갈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의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새롭게 신장시켜 나가야 할 민주주의에 대해 눈을 감거나 마음의 열정을 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은 너무나 굳게 닫혀있다. 아니 우리들은 그러한 민주주의 운동을 스스로 억압하였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둔감해져 버린 것이 그 증표이다.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증표이다. 그런 돈이 ‘빛 좋은 개살구’로 남아 있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이자로 나가는데도 말이다. 물론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허울뿐인 자산을 내던질 용기가 나지 않을 뿐이다. 두려움이라는 병마를 치유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 체제의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자산을 내던지고 싸우는 순간 은행과 금융권이 망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는데도, 우리들 개개인은 은행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튼튼한 모래알로 남아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