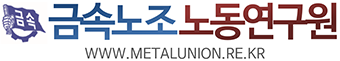<칼럼> 슬픔을 넘어 저항하는 사랑으로
슬픔을 넘어 저항하는 사랑으로
김영수(경상대)
쓰고 싶지 않은 꺼리인데 쓰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도 아니다. 공감대를 형성한 채 살고 있다는 자존감도 아니다. 그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또 다른 죽음을 보면서 너와 나의 자기사랑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다들 ‘세월호’ 침몰과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 때문에, 슬픔과 애도의 시간이 하루 하루를 참으로 더디게 만들고 있다. 국가 전체가 여흥의 시간을 슬픔과 연민의 시간으로 메우면서,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구할 수 있기를, 단 한사람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염원을 진도 앞 바다로 보내고 또 보내고 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유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픈 마음이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참으로 슬프고도 슬픈 재앙이다. 따뜻하고 소박한 정이 메말라 가는 세상에, 누구는 투박하게 또 누구는 분노하며,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과 시간이야말로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글픈 사랑일 것이다. 참으로 착하고 순박해서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이 현실에 슬픔과 애도를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슬픈 재앙 앞에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확인하는 사랑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앙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일, 또 다른 재앙을 막는 예방의 일,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과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도 치유해야 하는 일 등을 모두가 말하고 있다. 세월호에 승선한 것들의 문제,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박직 승무원들의 문제, 세월호를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 선박회사와 관리기관의 문제, 재난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문제 등이다. 이런 사랑이 단지 슬픈 재앙의 공감대에서 벗어나 있다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는 ‘자기 사랑’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정말 모두가 그 공감대에 서서 감정을 표시하고 있다. 어제는 사람들의 죽음을 강요했던 ‘탐욕의 제국’과 그 제국의 편에서 기생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죽음의 재앙 앞에서 슬픔을 공감하면서 똑 같은 감성의 틀에 들어와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침묵이 금’이라는 경구를 온 몸으로 보여주면서 제2차 학살을 감행하고 있다.
‘탐욕의 제국’은 늘 사람들의 억울한 주검을 뱉어내고 있다. 죽음의 굿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도 노동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의지와 무관하게 너와 내가 죽어가고 있다. 그 주검들이 온 천지에 널부러져 악취가 진동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중독되어 느끼지 못하고 있다. 육신의 죽음만이 주검이 아닐진대. 정신이 죽고 있어도, 마음이 죽고 있어도, 정서가 죽고 있어도, 사랑이 죽고 있어도, 그러한 죽음을 우리 스스로 애써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 ‘탐욕의 제국’에 대해 너그러운 경험을 많이 한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일하면서 살고 있다는 자기 함정, 눈만 살짝 감으면 내 육신이 편할 것이라는 자기 함정, 그리고 보고도 보지 못하거나 들어도 듣지 못한 척하는 자기 뻔뻔함이 그것이다. 육신 이외의 죽음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데,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
슬픈 재앙은 ‘탐욕의 제국’이 만들어 낸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 제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참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세월호에 갇혀 죽은 사람들 중에서 학생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한 짧은 생의 시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오랜 생의 시간을 살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탐욕의 제국’에서 진정으로 잘 살다가 죽는 것은 일상적으로 강요당하는 죽음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육체와 정신과 사랑의 존재를 늘 확인하는 삶일 것이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저항하는 사랑’, 이것이 ‘세월호’ 속의 주검들에게 바칠 수 있는 진짜 사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