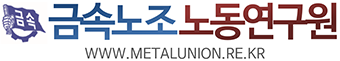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최근 정치이슈는 촛불혁명과 대선이고, 경제이슈는 제조업 쇠퇴와 4차 산업혁명이다. 경제침체와 정경유착으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경제계 수장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자동화”, “생산성”, “자원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협소하게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개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스마트팩토리는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킹” 개념이다.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해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대량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각 부품과 기계·설비가 독자적인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서로 대화한다. 중앙집중식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므로 하나의 공정이 멈추어도 전체가 멈추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기저에 어떤 사상과 철학이 있는지, 변화를 추동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독일은 공동결정법에 의한 수평적 의사결정구조와 노동의 인간화를 중시하는 철학을 배경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설계하였다.
크라우드 슈밥은 예전과 변화의 속도, 깊이, 폭이 다르고 하나의 혁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혁신이 묶어서 일어나고,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변할 수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은 제조공장의 변화를 넘어, ICT융합에 따른 물류, 금융, 에너지 등 산업계와 의료 및 건강, 교통,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주체의 철학과 목적에 따라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사고와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경제적 풍요와 여가를 주며, SNS와 블록체인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소수가 독점하여 다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로봇에 의해 상시고용이 사라지고 단기 계약이 일반화 되며, 극소수의 거대한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가 양성되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면 재양이 될 수 있다.
언론은 한국의 제조업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료적인 행정 절차나 정보이용의 폐쇄성 등의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고용, 환경, 복지, 안전, 노동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까지 삭제한다면 곤란하다.
현재 산업계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노동의 인간화', '사회적 안전장치', '공공성 확대' 등의 문제를 배제한 채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실체, 그리고 노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글의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