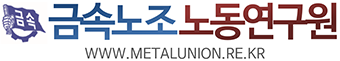<칼럼> 약하고 따뜻한 국가를 그리워하며
2013-4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칼럼
약하고 따뜻한 국가를 그리워하며
김영수
얼마 전에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압축적이고 긴장감이 돌거나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위 대중적인 흥행 영화의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영화는 나에게 참으로 따뜻하게 다가왔다. 주인공 최해갑의 자유로운 영혼도 따뜻했고 아주 넓디넓은 울타리 속에서 자식을 방목하면서 키우는 것도 따뜻했다. 국가 속에 살면서도 국민으로 살지 않겠다는 주인공의 대사는 나를 빵 터지게 하면서도 약간은 지루해질 시간을 잘 넘기게 하였다.
나는 영화 속의 주인공 최해갑처럼 무정부주의자도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속에서 국민으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권력과 국가는 첩첩산중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나를 빵 터지게 했다. 그것은 국가가 공권력을 앞세워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었던 사건이었다. 국민에게는 늘 법을 앞세워 법의 잣대를 내세우면서 국가 스스로 법의 잣대를 부러뜨리는 대사건이었다.
서울 한복판인 대한문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과 함께 쌍용자동차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불법적으로 짓밟았다. 국가는 이것도 모자라 투쟁의 중심인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을 불법적으로 구속시키려 하였다. 지금 현재도 노동자들이 얇은 천막으로 투쟁의 공간을 만드는 순간 국가는 군홧발을 들이밀어 짓밟고 있다.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진주에서는 경상남도가 환자들의 목숨을 돈으로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폐업시켜 공공의료를 포기하려하고 잇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의 공공기관들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권력을 앞세워 불법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국가가 참으로 무섭고 무지하다는 생각이 든다.
권리와 권력이 정치적 공동체의 본질이자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국가는 본래 사람들 간의 계약으로 만든 정치적 공동체를 새로운 법률로 지배하고자 등장한 주체이다. 맞는 말이다. 내가 만든 ‘권리의 동심원론’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와 실정법적 권리에서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 약한 주체에 불과하다. 국가는 치외법권을 누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누군가를 지배하는 권력체가 아니다. 국가는 관료나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는 관료기구에 부여된 직급이나 직위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연적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의 따뜻한 생활을 위해 자그마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권리의 동심원 속에 있는 권한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에 비해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는 약해도 국민의 자연적 권리는 강해야 한다. 계약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실정법적 권리도 국민의 자연적 권리를 보장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의 자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혹은 국민과 맺은 계약에서 자신의 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국민은 범죄자인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국가는 자신의 자연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따뜻한 국가이다. 특히 살아가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눈길을 보내는 국가이다.
산 너머 남쪽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면서 산을 넘어가려 한다. 힘들어도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슬러 넘어가려는 것도 그 희망의 끈이다. 산 너머 남쪽에는 따뜻한 국가가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따뜻한 국가는 언제 올 것인가 그저 그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