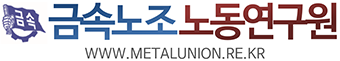<칼럼> ‘어깨걸기’가 그리운 너와 나의 시간
2014-10 노동연구원 칼럼
‘어깨걸기’가 그리운 너와 나의 시간
김영수 (경상대)
그립다. 아주 많이 그립다. 어깨동무를 했던 친구가 그리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늙음을 깨닫고서 멀리 가버린 시간과 추억을 부여잡으려는 너와 나. 아스라이 멀어져 간 젊음의 시간과 공간에서 부딪히고 깨졌던 어깨가 알싸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어깨 붙잡고 공장과 광장과 거리를 누볐던 동지가 그리워 그 옛날 그 선술집 찾으려 어슬렁거리다가 온데간데없는 동지들의 시간과 추억만 되새기다가 어깨 축 늘어뜨리고 낯선 건물과 사람들에게 등을 내미는 너와 나.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사람들의 왁자한 추억 만들기도 그저 또 다른 너와 나의 그 옛날 그 모습으로 남을 뿐이다.
세월이 등을 떠밀고 늙어가는 육신이 등을 떠밀어, 혈기가 왕성했던 그 자리에 외로움이 대신해서일까. 세월과 경험을 앞세워 까칠함 대신에 둥글고 원만함이, 날카로운 이성과 논리 대신에 감성이 보편화되는 늙음. 자신의 감성만이 전부인 독선적 늙음. 세상에 굴복하는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이치일까. 묻고 도 또 물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둥글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월의 현명함이라고 하지만, 까칠하면서도 날카로운 이성과 논리에 대해서는 늙어서 드러내는 부덕의 소치로 간주한다.
혼란스러워도 너와 나에게 다시 묻고 싶다.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렵지만 단순하게 시작하고 싶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혼자서 살아가지 않듯이, 앞으로도 너와 내가 함께 어깨걸고 살아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시간과 공간도 따지고 보면, 나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어깨걸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젊은 혈기와 건강한 육신이 공장의 기계와 함께 닳아져 가면서 부쩍 그 시절에 어깨를 꽉 잡아 주었던 동지조차 하나씩 하나씩 어디론가 떠나는 지금. 누구는 가족만의 시간과 공간으로, 누구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으로, 또 누구는 돈의 시간과 공간으로 떠나는 동지에게 가슴을 후볐던 손가락질과 독설적인 말 대신에 어깨를 내밀어주지 못했던 지금. 내 어깨를 절실하게 요청하는 동지들의 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몸과 마음을 녹여주길 원하는 동지들 혼자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을 자리가 넓고도 넓은 동지들의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 나만의 시간과 공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맞대고 몸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넓혀가는 어깨걸기.
노동현장은 투쟁의 공동화와 함께 죽어가고 있고 민주노조운동의 관성화에 대해 아우성이면서도, 존재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발버둥거림에도, 너와 나는 서로 어깨를 걸지 않고 있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로, 서로가 묵인하고 방관하면서 어깨를 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었던 어깨조차 슬며시 풀어버린다. ‘나’와 ‘너’를 합친 합성어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너와 나를 연결하는 ‘다리’의 의미라 할 수 있는 신조어 ‘ㅒ’가 됩니다.
무수한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외로운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금속노동자들의 투쟁뿐만 아니라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노동의 권리를 지키려 했던 교원노동자들의 투쟁. 지금도 마찬가지다. 연금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생애임금을 앗아가려는 국가와 자본에게, 투쟁의 깃발을 꽂은 공무원 노동자들. 서로가 어깨걸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11월에는 보통 한자리에 함께 모여 힘을 과시하는 장이 많이 열린다. 전국노동자대회나 전국민중대회 혹은 각 조직별로 추진하는 전국적 대회가 열리고, 그 대회에 수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목소리와 확성기 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내건다. 조직과 세력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민다. 너와 나는 그 옛날의 시간과 공간을 2014년 11월로 부활시킨다. 잠시나마 너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투쟁의 ‘방관주의 혹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조직과 세력의 힘은 일회적인 대회나 투쟁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터’에서 과시될 필요가 있다. 너와 내가 딛고 서 있는 노동의 ‘공장터’나 지역의 ‘생활터’에서 너와 내가 어깨걸기를 일상적으로 한다면, 노동자와 민중들의 전국적인 대회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은 너와 내가 어깨를 걸어 메치는 일상적인 투쟁에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