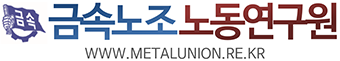시간 빈곤과 시간 주권 찾기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장 내 변화는 미미하다. 사무 관리직이 다수인 사업장에서는 그 동안 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큰 갈등이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사업장 내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정부가 기업 부담을 이유로 6개월의 단속 유예를 선언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이라 주장하나 기업들은 ‘적용 유예’로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근로시간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강행규정인데,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행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이 없으니 기업들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이다. 둘째, 52시간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직원 300명이 넘는 기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에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경영의 어려움을 52시간제와 연계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려는 낡은 정치공세일 뿐이다.
사실 주52시간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그 동안 잘못 운영된 근로시간 규제의 정상화 조치이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함에 따라 토·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했다. 정부의 근로시간에 대한 편법 해석으로 주 68시간까지 허용해왔다. 이번 법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편법 운영의 싹을 잘라 버린 것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너무 길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다. 이런 이유로 노사정은 2010년 전 산업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오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당시 노사정은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 유지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10년 내 1800시간대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제 시한이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의 노동시간은 목표에 비해 269시간 더 많은 상태이다.
장시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 빈발,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한다. 장시간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경영에서도 비효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6년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종합보고서’에서 ‘습관화된 야근’을 가장 심각한 기업문화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직장인들은 주중 2~3일을 야근하고 있고, 3일 이상 야근자도 43.1%나 됐다. 대한상의는 야근을 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야근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굴뚝산업 시대의 노동문화가 여전히 한국 기업문화를 지배하며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장시간노동은 여가시간 없는 시간 빈곤(Time Poor)을 가져온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 빈곤자들이다. 직장에의 통근시간은 OECD에서 가장 긴 58분으로 OECD 평균 통근시간인 28분의 2배를 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출근 준비, 출근, 직장생활과 퇴근으로 사용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인의 낮은 행복지수는 최장의 근로시간에서 기인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간빈곤으로 연계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에 더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시간 빈곤이 심각한 저임금노동자들은 그동안 임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 체제가 강요하는 시간 빈곤의 구조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시간 사용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개인이 갖는 ‘시간 주권(working time sovereignty)’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의 시간이 임금을 볼모로 자본에 종속돼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시간 주권은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서 시간 주권 찾기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52시간 상한제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올해 독일 금속노조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으로 주당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요구권’을 도입했다. 육아, 간병 등의 사유가 있는 노동자는 2년간 주당 28시간 근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주당 40시간까지 연장해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노동시간 유연화가 도입되려면 최소한 장시간노동의 오명은 탈피할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언론이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의 모범으로 독일을 소개한다. 독일은 1995년 산업 전체 평균 주 38.5시간, 금속·철강·전기산업의 경우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장시간노동의 탈피를 전제로 한다.
앙드레 고르(Andre Gorz)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 확보는 공동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의 새로운 매력’과 ‘감정의 소생’이라는 자극을 준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도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꾀해보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