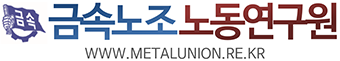권리를 사랑하는 상식
2017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여기저기에서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가 넘실대고 있다. 촛불정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행정부가 져야할 짐이자, 권리의 자존감을 찾으려 하는 ‘민’의 욕구려니 하면서도 혼란스럽다. 문재인 행정부나 그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달라, 기다려 달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노동자들 스스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정책의 수립에 관심이 없는 듯한데, 노동자들은 왜 실체적 ‘권리’의 자유로움을 누리려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자유로운 사회란 어떤 의미일까? 어렵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해보자. 노동조합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운동을 사랑스럽게 아우르는 사회가 그 출발이라고 본다. 간단하게 ‘노동조합에게 자유를!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사랑을!’로 테제화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랑하자는 상식인 것이다.
권리를 사랑하지 않는 현상은 즐비하다. 그것은 권력이 권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문재인 행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맺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를 행정지침의 방식으로 부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하기에 급급하고, 비정규직의 제로(zero)화를 그저 ‘속옷은 비정규직화, 겉옷은 정규직화’로 치장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1월, 촛불항쟁의 불을 지폈던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부들을 적폐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국정농단의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나 특정 정당만이 적폐인양 치부하지 말자. 노폐물과 폐습은 '상식의 눈'에서 벗어나 있고, 사회의 구석구석에 절어 있고 뼛속까지 전이된 악성 종양들이다. 헬조선도 그렇고, 노동 천대도 권리 불감증도 마찬가지다. 적폐청산의 시작이 타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순간부터라는 것은 상식이다. 굳이 ‘역지사지(易地思之)’할 필요조차 없다.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듯이,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언행의 시작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부터다. ‘권리를 사랑하는 상식’이란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갖가지의 근거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움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역설의 상식만이 넘친다. 물론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류의 상식으로 작동하는 비정상과 가면으로 가려진 의사정상만이 지배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1등만이 있고 2등과 꼴찌가 없는 사회, 개인의 출세와 권력만을 존중하는 사회, 돈이면 다인 사회의 모습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앙상하기 그지없게 만든다. 아타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관계의 융합적 공동체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저 나만 잘나고 잘 살면서 상대방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만이 젠체하고 있다.
그래서 종종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 ‘나는 나의 실제 주인인가? 나는 나에게 주인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대체 주인노릇이란 어떤 형상일까?’ 등이다. 누구나가 자신의 주인임을 자처하곤 하지만, 정말 맞는 것일까. 다시금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던지고 싶은 상식적 질문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싶다. 아마도 많은 노동자들 스스로 일터나 삶터에서 확인하는 존재감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들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다. 그 어떤 노동자가 아주 상식적인 이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저 존재감을 찾거나 갖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노사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상식이었다. 아주 익숙하고 상식화된 방식이다. ‘무임승차’의 터널도 참으로 길고도 길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 숨기기 혹은 권리 타자화’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가 짓밟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권리는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을 만들어 낸 수원지다. 권리를 사랑해야만 할 상식이다. 이제는 남이나 구조만을 탓하지 말자. 자존감의 시작과 끝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무한 사랑’이다. 우리들이 자신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면서 자존감을 찾겠다는 자기모순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다. 권력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왔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너무나 강렬한 빛 때문에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거나,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