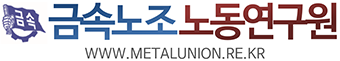<칼럼>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김영수 (경상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삶의 경험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갈등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로가 제3의 중재자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중재자가 나서기기도 한다. 법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국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 혹은 법의 의미와 내용을 왜곡하여, 인민에게 고통을 줄 때이다.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법대로 집행하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가 법의 최고 가치인 정의(justice)를 의도적으로 실현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대로인가? 맘대로인가? 최근 대법원이 권력자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했던 하급법원의 원심을 깨고, 다시 내려 보내는 ‘원심파기환송’을 즐기고 있다. 인민들은 이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KTX 승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자 직위 확인 소송사건에서, MBC노동자들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사건에서,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통령선거 불법개입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두 힘을 앞세우는 권력자들의 편에 손을 들었다. 대법원이 판결의 절대권력자라는 말인가, 아니면 하급법원이 무식하고 무능해서 판결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은 어떤 측면으로 보건, 사법부 스스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법대로’라는 담론이 한 시대를 지배하기도 하였다. ‘대쪽판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1997년과 2002년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이다.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과 무관하게,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당연함을 제기하여,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아마도 두 가지 측면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나는 법은 있는데 돈이나 힘 앞에서 무력한 법의 현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판하고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법을 무시하고 거리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던 노동자와 민중들의 정치행위를 ‘법대로’ 혹은 사법부 ‘맘대로’ 단죄해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자는 사명이었다.
아주 유명한 경구도 생각난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다. 그 진위 여부를 놓고서 이견이 있지만, 한국에서 만큼은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적 법집행을 정당화하는데 악용할 수 있도록, 정치사상을 연구했던 교수들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거의 정설에 가깝다. 법 만능주의 혹은 법 순결주의를 내세우는 측면에서 보면,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조차 법에 순응했는데,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탈법적인 정신과 행동을 국가가 용서하지 말라는 독재자의 메시아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악함’ 그 자체였다. 루돌프 폰 예링은 ‘선한 법은 인민의 권리를 진짜 보장하고 집행하는데 반해, 사악한 법이나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실정법을 둘러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기보다, 불법을 감수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이 지배했던 시대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법이 없어도 서로가 납득하고 인정했던 불문율이 그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상식도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한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수단은 무엇일까. 헌법이라고 하지 말자! 헌법이 아무리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인민은 일상생활에서 헌법의 하위법이나 시행령들, 심지어 규칙이나 규정의 위력을 접하면서 살아간다. 인민 대다수가 헌법의 힘에 쉽게 의존하려 하지 않는 이유이다.
따라서 법의 정당함을 판단하는 버린(Berlin)의 기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나는, 법은 구성원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발휘하는 최고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 인간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헌법이 아닌 하위법이나 법령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만날 때, 또 자본가와 노동자가 만날 때, 누군가는 항상 그것들을 ‘천의 얼굴’로 만들곤 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이용하는 악행처럼, 자의적인 기준과 적용에 대해 분노하지만, 국가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법을 사악하게 적용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 인민이 이런 국가를 상대로 저항하지 않는 한, 정의와 상식이라는 법의 가치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서 부정의와 몰상식으로 변해버린다. 인민에게 남는 것은 그저 상처와 고통뿐이어서, 투쟁하고 싶어도 싸울 힘조차 없는 무기력뿐이다. <끝>